C-journal
- 신창재 교보생명 디지털 전환 현주소는 어느쪽? 이사회에 IT 전문가 있는데 개발비는 줄어
- 김주은 기자 june90@c-journal.co.kr 2025-10-01 07:10:55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수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DX)'을 경영 화두로 얘기해왔다. <교보생명> |
9월9일 열린 팀장 및 임원 미팅에서 내년 디지털 전환(DX)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내년 사업 계획서를 주문했다.
8월 교보생명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선도 회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다.
창립 61주년인 2019년에도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강조했고 2020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의 경영 방침은 ‘생존을 넘어 디지털 교보로 가자’로 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개발비·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하지만 교보생명의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신 회장의 발언과 결이 다른 대목이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교보생명의 무형자산 가운데 소프트웨어 항목은 178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1.4% 줄어들었다.
최근 5년(2020~2024년)의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변동 추이를 봐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0년 492억 원, 2021년 405억 원, 2022년 377억 원, 2023년 278억 원, 2024년 201억 원으로 매년 평균 20%가량 줄어들었다.
개발비 또한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교보생명이 보유한 무형자산 가운데 개발비로 구분된 항목을 보면 668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4%가량 줄었다.
역시 최근 5년의 추이를 봐도 2022년을 제외하고는 쭉 감소해왔다. 2020년 1640억 원, 2021년 1367억, 2022년 1538억 원, 2023년 1124억 원, 2024년 696억 원으로 증가한 해를 고려해도 평균 17%가량 줄어든 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AI와 관련한 개발비만 따로 모아둔 자료는 추산하지 않는다”며 “해당 항목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AI 투자와 관련해서 단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업계 1위 삼성생명과 비교하면 더 커지는 변동폭
생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단순 비교해보면 삼성생명은 개발비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생명의 올해 상반기 개발비는 20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4%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의 개발비 추이도 변동폭이 크지 않다. 2020년 2705억 원, 2021년 2054억 원, 2022년 1875억 원, 2023년 2006억 원, 2024년 19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7%가량 줄어들었다.
소프트웨어 항목도 5년 전에 비해 확실히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2020년 590억 원, 2021년 459억 원, 2022년 362억 원, 2023년 379억 원, 2024년 342억 원으로 매해 평균 12%가량 감소했다.
신창재 회장이 강조하는 DX를 실질적 숫자로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고서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에서 “보험업 내 AI 활용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IT 전문가 포함된 이사회 구성은 돋보여
다만 한쪽에서는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나온다. 생보사로서는 드물게 IT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사외이사 5명 가운데 문효은 사외이사는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한 문과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IT 벤처붐을 이끌었던 1세대 인터넷 벤처사업가이기도 하다.
문 이사는 1990년대 중반 아이비즈넷이라는 IT 서비스 소개 회사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소위 ‘닷컴 붐’을 타고 성장했으며 문 이사는 2000년 이 회사를 코스닥 상장사인 피코소프트에 매각했다.
문 이사는 회사 매각 이후 IT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문과 출신이지만 IT 전문가로 불리기에 손색없는 이력인 셈이다.
문 이사의 존재는 교보생명의 경쟁사인 다른 생보사들의 이사회 구성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의미가 깊다.
2025년 반기보고서 기준 생보업계 ‘빅3(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가운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의 이사회에는 IT 전문가가 포함돼있지 않다. 김주은 기자
- 이 기사가 어땠나요?
많이 본 기사
-
- 신창재 교보생명 승계 복안 있나, 의사 하다 회사 물려받을 때 뼈아픈 교훈 얻었는데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1953년생으로, 올해 72세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신 회장의 승계 계획은 베일에 싸여 있다. 수십 년 전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것인지 불명확하다. 신창재 회장은 1996년..
-
- 교보생명 성장엔진 금융지주사 전환도 IPO도 답보상태, 신창재 숙원사업 답답하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라는 숙원 사업이 있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지만 미래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선 기필코 넘어서야 하는 관문이다. 2005년부터 언급됐던 교보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
- 한국맥널티 커피 위에 제약과 건기식도 키워, 이은정 올해 매출 1천억 돌파 가시권
- 이은정 한국맥널티 대표는 커피에 치우친 회사의 매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실제로 한국맥널티의 매출액 중 커피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커피 매출 비중은 2022년 76.26%이었으나 202..
뉴 CEO 프로파일
뉴 채널 WHO
-
-

-
GS리테일 편의점 침체기 어떻게 극복하나, 오너4세 대표 허서홍 위기 돌파 전략은?
- [채널Who] 국내 편의점 산업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섰다.
편의점업계 양강인 GS25와 CU의 영업이익이 30% 이상 감소했고, GS25는 매출&mi
-
-

-
중국언론은 강압적 미국에 대하는 한국 정부가 '실용주의' 선택할 것이라 봤다
-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원인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지적이 나왔다.
29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
-

-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 추진 논의한다
-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
25일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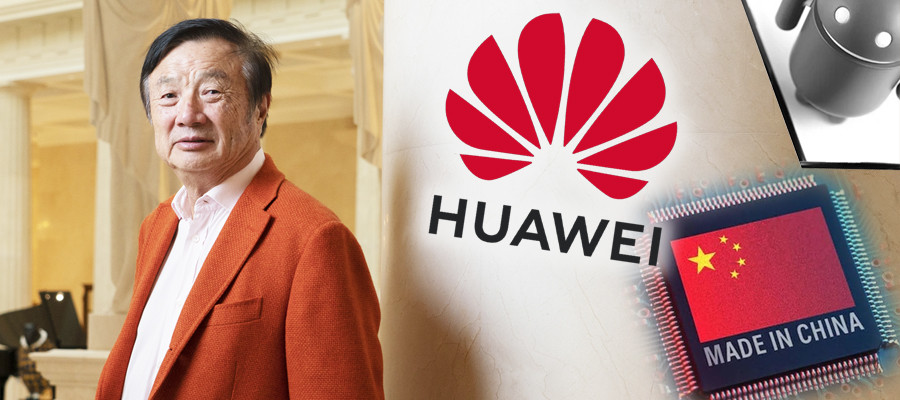
-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 AI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 도전, 중국정부 기대대로 엔비디아 대체할까
-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이어가며 양국의 협상 전략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엔비디아를
-
-









